교육에서 생성형 AI가 사유에 미치는 영향
교육에서 생성형 AI가 사유에 미치는 영향
교육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입은 책임감 있는 사유와 지적 정직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이 논문은 GenAI의 교육적 도입을 철학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성찰하고 있어 매우 흥미롭습니다.
1. 연구의 목적 (Purpose of the Study)
본 연구는 생성형 AI(GenAI)가 교육에 도입되면서 인간의 핵심 지적 활동인 사유(thinking)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자들은 단순히 GenAI의 장단점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무사유성(thoughtlessness) 개념과 파울루 프레이리(Paulo Freire)의 비판적 교육학(critical pedagogy)을 이론적 도구로 삼아 GenAI가 개인의 지적 발달에 미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경고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학습자가 자신의 사유하는 주체성(thinking agency)을 지키고, 지적 정직성(intellectual honesty)을 바탕으로 한 책임감 있는 학습 문화를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역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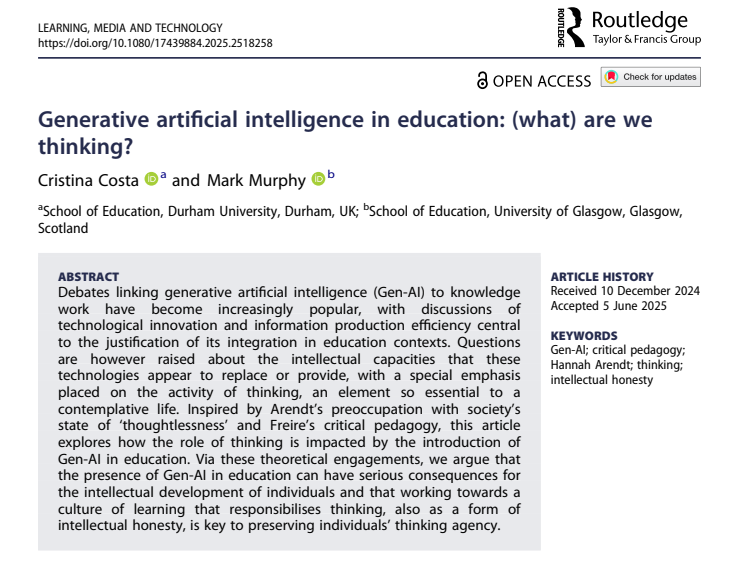
2. 연구의 방법 (Methodology)
이 연구는 실험이나 설문 조사를 통한 경험적 연구가 아닌, 교육 철학과 사회 이론에 기반을 둔 이론적·철학적 탐구입니다.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적인 이론적 틀을 활용하여 GenAI 현상을 분석합니다.
-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사유 이론: 무사유성이 어떻게 악(evil)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GenAI가 사유 과정을 생략하게 만들어 비판적 판단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위험을 분석합니다.
- 파울루 프레이리(Paulo Freire)의 비판적 교육학: 지식을 주입하는 ‘은행 적금식 교육’을 비판하고, 학습자가 비판적 대화와 성찰을 통해 주체적으로 지식을 구성해야 한다고 본 프레이리의 관점에서 GenAI를 평가합니다. GenAI가 제공하는 편리한 정보는 프레이리가 비판했던 수동적 학습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이론을 엮어, 저자들은 GenAI가 교육의 본질에 제기하는 근본적인 도전을 조명합니다.
3. 주요 발견 (Key Findings / Arguments)
저자들은 GenAI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핵심 주장들을 제시합니다.
- 사유의 자동화와 무사유성의 조장: GenAI는 즉각적인 답을 제공함으로써,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한 의미 찾기 과정으로서의 사유(thinking as meaning-making)를 건너뛰게 만듭니다. 이는 개인이 스스로 사유하지 않고 주어진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아렌트가 경고한 ‘무사유성’ 상태를 조장할 위험이 큽니다.
- 비판적 교육학과의 불화: GenAI는 효율성과 정보 전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학습자의 지적 자율성과 해방을 목표로 하는 비판적 교육학의 원칙과 충돌합니다. 학습을 지식의 소비로 전락시켜, 학습자를 앎의 과정에서 소외시킬 수 있습니다.
- 책임감 있는 사유의 필요성: 저자들은 GenAI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이 책임감 있는 사유(responsible thinking)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단순히 AI를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지적 활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그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 지적 정직성의 회복: 책임감 있는 사유는 지적 정직성(intellectual honesty)이라는 실천적 원리로 구체화됩니다. 이는 자신의 지적 결과물이 스스로의 고뇌와 성찰의 산물임을 존중하고, 쉬운 길을 택하려는 유혹에 저항하는 태도입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Conclusion & Implications)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GenAI가 교육에 가져오는 변화를 단순히 기술적 혁신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적 활동과 자율성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GenAI는 학습 과정을 단순화하여 학습자를 무사유와 의미 상실의 상태로 이끌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학문적 역량과 지적 진실성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계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 사유 과정의 가시화: 결과물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고민하고, 탐구하는 사유의 과정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기고 평가하는 교육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 비판적 교육학의 재조명: 기술 중심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학생이 학습의 주체가 되어 비판적으로 질문하고 대화하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 지적 정직성 교육: 표절 방지 교육을 넘어, 자신의 생각에 책임을 지는 ‘지적 정직성’이 왜 중요한지를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이를 교육 과정에 통합해야 합니다.
5. 리뷰어의 생각 더하기 (ADD+ One)
(1) 이 연구의 탁월한 점 (강점)
-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다: 이 논문은 ‘GenAI로 어떻게 부정행위를 막을까?’라는 지엽적인 질문을 넘어, ‘AI 시대에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교육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한나 아렌트와 파울루 프레이리라는 거장들의 사상을 현대 기술 문제에 접목하여 논의의 깊이를 더한 점이 매우 탁월합니다.
- 새로운 개념의 제시: ‘책임감 있는 사유’와 ‘지적 정직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GenAI 시대에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인 가치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기술에 대한 수동적 대응이 아닌, 교육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중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2) 교육 현장을 위한 추가 제언
- ‘생각의 지도’ 그리기: 학생들에게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의 흐름을 기록하게 하는 ‘사고 과정 포트폴리오(Thinking Process Portfolio)’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에서 시작했고, GenAI에게는 어떤 도움을 받았으며, 그 답변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수용 또는 기각했는지,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스스로 기록하고 성찰하게 하는 것입니다.
- 의도적으로 ‘불편한 질문’ 던지기: 교육자는 GenAI가 쉽게 답할 수 없는, 정답이 없는 회색지대의 질문을 의도적으로 던져야 합니다. 윤리적 딜레마, 가치 판단, 다양한 관점의 비교 등을 요구하는 논쟁적 질문을 통해 학생들은 AI의 답변을 넘어 스스로 사유하고 판단하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6. 추가 탐구 질문 (Further Research Questions)
- 장기적으로 GenAI 사용이 학생들의 메타인지(metacognition) 능력과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발달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종단 연구가 필요합니다.
- 지적 정직성을 함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다양한 교육 환경(초등, 중등, 고등)에서 검증하는 연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육자들은 GenAI로 인해 자신의 사유하는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느끼는지, 그들의 인식과 경험에 대한 심층 연구도 중요합니다.
출처: Costa, C., & Murphy, M. (2025, June 17).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what) are we thinking?. Learning, Media and Technology. https://doi.org/10.1080/17439884.2025.2518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