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wyer의 사회적, 분산적 창의성 모델과 AI 공동 창작의 미래
Sawyer의 사회적, 분산적 창의성 모델
R. Keith Sawyer의 연구는 창의성에 대한 전통적인 통념, 즉 위대한 아이디어는 고독한 천재의 머릿 속에서 번뜩이는 영감으로 탄생한다는 ‘고독한 천재 신화(lone genius myth)’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의 이론은 창의성이 본질적으로 사회적이고 협력적인 과정의 산물임을 강조합니다.
협력적 창의성의 핵심 개념
🧠 집단 천재성 (Group Genius)
Sawyer는 획기적인 창의성과 혁신이 개인의 고립된 노력이 아닌, 집단 내에서의 협력, 대화, 그리고 즉흥연주(improvisation)를 통해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아이디어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각자의 작은 기여를 더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창의성은 개인이 소유하는 특성이 아니라, 집단적 상호작용 속에서 발현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 분산된 창의성 (Distributed Creativity)과 협력적 발현 (Collaborative Emergence)
분산 인지(distributed cognition) 개념을 창의성 연구에 적용하여, Sawyer는 창의성이 한 개인의 정신 과정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사람, 도구, 그리고 환경에 걸쳐 ‘분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재즈 밴드나 즉흥극단과 같은 집단에서는 예측 불가능성, 순간적인 상호 의존성, 그리고 참여자 간의 평등한 기여를 특징으로 하는 ‘협력적 발현’ 과정이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서 최종 창작물은 누구 한 사람의 의도나 계획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 그 자체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발현(emerge)’됩니다.
zigzag 지그재그 경로 (The Zig-Zag Path)
Sawyer의 ‘지그재그’ 모델은 창의적 과정을 아이디어에서 해결책으로 나아가는 직선적인 경로가 아니라, 8개의 단계를 거치는 예측 불가능하고 비선형적인 여정으로 묘사합니다. 이 과정은 정해진 계획을 따르기보다는, 예기치 않은 전환과 실패를 통해 새로운 길을 탐색하는 ‘방황’과 ‘즉흥’에 가깝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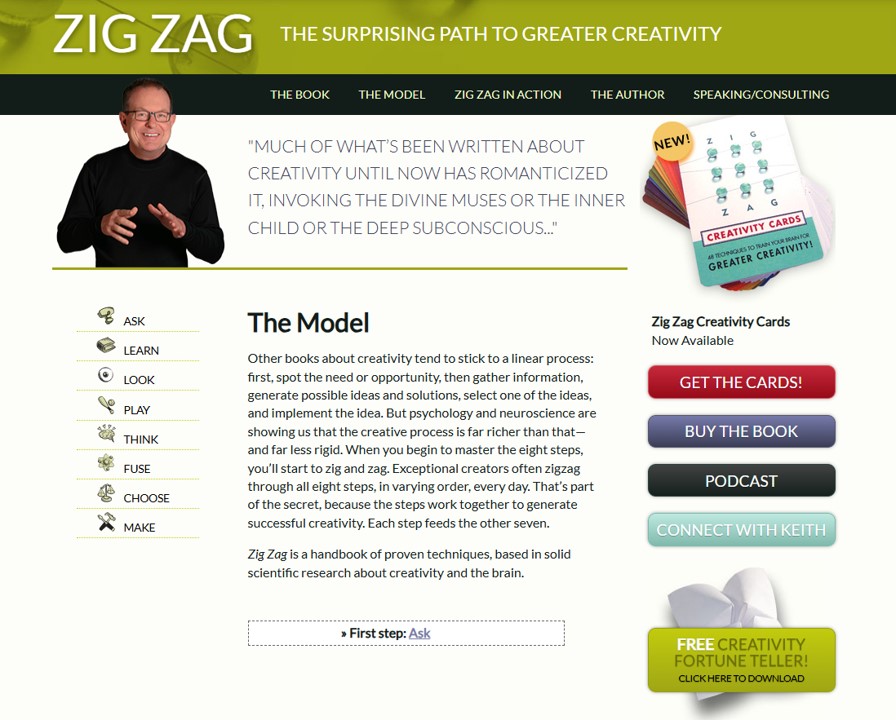
🤖 AI 공동 창작의 한계와 도전
Sawyer의 모델은 인간의 협력에 대한 강력한 설명을 제공하지만, 이를 인간-AI 공동 창작(co-creation)에 적용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따릅니다. 그의 모델은 미묘하고, 체화되어 있으며, 상호작용적인 역학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공동 창작 AI 시스템들은 진정한 협력적 파트너라기보다는 정교한 ‘도구’로서 기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문제 명확화와 같은 창의성의 모호한 초기 단계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의 생성이나 가치 평가는 여전히 인간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협력적 발현’의 핵심인 예측 불가능성과 공유된 통제권을 AI가 구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과거 데이터로부터 확률적 모델을 학습하는 AI가, 진정으로 즉흥적이고 발현적인 과정에 참여하여 기존 데이터의 조합을 넘어서는 ‘진정한 새로움(genuine novelty)’을 생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회의론이 존재합니다.
⚡️ 즉흥연주 격차 (Improvisation Gap)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인간-AI 공동 창작의 근본적인 한계, 즉 ‘즉흥연주 격차(improvisation gap)’를 발견하게 됩니다.
- Sawyer의 창의성: 재즈나 즉흥극 연구에 뿌리를 두며, 예측 불가능하고 우연적인 상호작용의 발현적 산물로 정의됩니다.
- 현재 AI (LLM): 훈련 데이터에 기반하여 가장 ‘있을 법한’ 결과를 생성하도록 설계된 예측 및 확률 모델입니다.
AI는 놀라움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움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이는 Sawyer가 ‘집단 천재성’의 엔진으로 지목한 진정한 즉흥성, 즉 예측 불가능성으로부터의 발현이라는 핵심 메커니즘과 현재 AI의 핵심 메커니즘인 확률로부터의 예측 사이에 근본적인 불일치가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AI는 기존 패턴을 재조합하여 창의성을 ‘시뮬레이션’할 수는 있지만, Sawyer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즉흥적이고 발현적인 창조 과정에 참여하는 데에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새로운 방향: 협력 비계 (Collaboration Scaffold)
‘즉흥연주 격차’를 고려할 때, Sawyer의 모델을 AI에 적용하는 더 현실적인 방향은 AI를 동등한 창의적 파트너로 설계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대신, AI를 인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협력 비계(collaboration scaffold)’로 설계하는 것이 더 유망한 접근법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AI의 역할은 집단 흐름(group flow)과 분산된 창의성을 촉진하는 조건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I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브레인스토밍 세션에서 아이디어 생성을 방해하는 ‘생산 차단(production blocking)’ 현상을 완화하는 진행자 역할
- 아이디어의 ‘지그재그’ 경로를 추적하고 기록하는 집단적 기억 장치 역할
- 서로 다른 팀원들의 아이디어를 연결하여 예상치 못한 연관성을 드러내는 역할
이러한 역할에서 AI는 발현적 의미에서 창의적인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발현적 창의성을 위한 환경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이는 공동 창작 AI의 목표를 ‘인공 협력자’에서 ‘협력 지원 시스템’으로 재정의하는 중요한 관점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참고문헌
- Sawyer, R. K. (2007). Group genius: The creative power of collaboration. Basic Books.
- Sawyer, R. K. (2013). Zig zag: The surprising path to greater creativity. Wiley.
- Sawyer, R. K., & DeZutter, S. (2009). Distributed creativity: How collective creations emerge from collaboration. Psychology of Aesthetics, Creativity, and the Arts, 3(2), 81–92.
